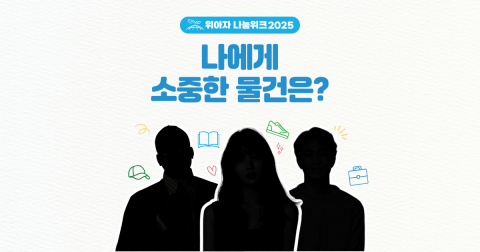“나눔이 일상이 되려면 – 기부문화의 확장과 계층 간 공감의 거리”
위스타트가 주관한 ‘위아자 나눔위크 2025’ 릴레이 캠페인이 다시금 기부문화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스타, 명사, 일반 시민이 함께 이어가는 나눔 릴레이는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가”라는 질문과 함께 기부의 일상화를 시도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약자와 기후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공 복지의 보완장치로 기능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 정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공공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민간 기부
한국은 고도 압축성장을 거치며 정부 주도의 복지 체계가 비교적 천천히 맞춰진 경우에 속한다. OECD 주요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복지지출률과 기부 참여율에서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복지를 보완하는 민간의 기부 활동은 그 자체로 중요한 사회 기능을 수행한다. 위스타트는 교육·건강·복지 통합지원을 지향하는 비영리단체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민간의 연대로 메우려 한다. 릴레이 캠페인이 일상 속 ‘의미 있는 기부 경험’을 시민 사회에 공유하는 이유다.
세대와 계층이 보는 ‘나눔’의 무게
흥미로운 점은 이번 캠페인이 SNS 인증, 온라인 참여, 카카오 알림 이벤트 등의 디지털 참여 구조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온라인 감성과 행동을 연결하고자 한 전략적 시도가 엿보인다. 기존의 오프라인 기부 중심 문화에서 탈피해 ‘참여하는 놀이’로 기부를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만 이러한 경험 중심 기부는 중장년 이상의 기부 세대가 중시하는 ‘지속적인 신뢰와 실용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즉, 세대 간 ‘기부 방식’에 대한 기대치와 의미 부여가 다르다는 점에서, 나눔 문화의 공감대 형성과 계층 간 문화 조율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소비와 연결된 나눔 – 성찰과 실천의 이중값
이번 위아자 나눔상점은 애장품 경매·래플·특별판매 등으로 기부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중심에는 스타나 명사의 ‘소중한 물건’이 있다. 명사의 기증품은 소비자에게 ‘소유 가치’를 주므로 기부자가 주는 감정적 연결과 소비자가 갖는 만족 사이의 교차점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기부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자칫 ‘소비로 포장된 기부’ 혹은 ‘이미지 마케팅’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기부의 독립성과 윤리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다.
기부문화와 시민 자발성의 제도적 접점
정책적으로 보면 한국은 법적 기부금 공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나 공제 범위의 제한, 또는 비영리단체 자격 요건의 불투명성 등은 시민 참여를 어렵게 한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려 할 때 그것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된다면 제도는 오히려 장벽이 된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간편성을 동시에 갖추는 디지털 기반 기부 플랫포밍, 비영리기관에 대한 공신력 인증 강화, 반복 참여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기부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위스타트의 시도가 그 시작점을 잘 짚었다면, 이제 그 실천을 생활 속에 안착시키는 지속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부상품 매칭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학교는 청소년 대상의 나눔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지역 커뮤니티는 정기 나눔 장터를 통해 자원재순환과 지역연대를 함께 꾀할 수 있다.
기부는 단지 손에 든 물건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심을 나누는 신호이며, 나의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에게 소중한 물건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에게 더 소중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기부 문화의 다음 단계가 시작된다.